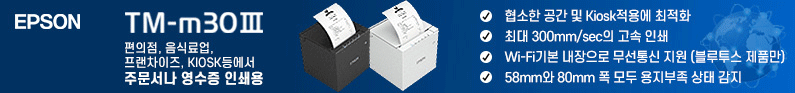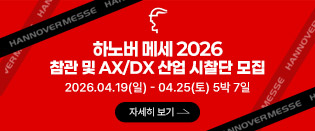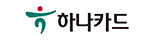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 (촬영·편집 : 헬로티 최재규 기자)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러닝 전국시대’다. 주말마다 도심 속 도로가 통제되고, 번호표 단 러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는 통계만 봐도 금세 체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이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체육 활동 가운데 ‘달리기’ 비중이 기존 0.5%에서 6.8%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 1회 이상 조깅을 하는 사람만 약 3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업계와 마케팅 보고서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 전체를 2017년 500만 명 안팎에서, 100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는 지표까지 나온다. 국회 자료를 정리한 마라톤 매체는 국내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회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0여 회로 급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참가자 수도 1만 명이 채 안 되던 상황에서, 지금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시장으로 커졌다. 서울 도심을 통째로 막아 4만 명 가까운 러너가 동시에 뛰는 장면도 이제는 뉴스라기보다 계절 풍경에 가깝다.
러닝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지금 좀 뛰는 사람들은 ‘운동 좀 해야지’ 수준을 넘어서, 시즌마다 목표 대회를 찍고 스마트 워치로 각종 지표를 관리한다. 시간당 거리를 뜻하는 페이스(Pace)부터 분당 발구름 수치인 케이던스(Cadence), 심박 수 등을 분석하며, 이전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러닝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러한 정보가 한데 집약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숫자로 비교하기도 한다.
이들은 퇴근 후 집 앞 코스를 한 바퀴 도는 생활 러너부터, 해외 메이저 대회를 버킷리스트에 올린 마스터스 러너까지 다양하다. 현시점 우리나라에서의 러닝은 장비·데이터·커뮤니티가 엮인 ‘프로젝트형 취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판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 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손목 위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 워치부터 대회 코스 곳곳에 배치된 계측기기 등 각종 장비가 러너를 지원한다. 해당 기술은 숨·심장을 초 단위로 기록하고, 수천 명의 랩 타임(Lap Time)과 영상을 동시에 수집해 서버로 보낸다. 또한 러닝화 한 켤레 뒤에는 실험실과 테스트 장비, 밑창을 수십만 번 두드리는 로봇·자동화 설비들이 있다.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지친 몸을 다시 세우는 재활실에는 각종 로봇과 기계 장치가 돌아가고 있다.
이번 RUN+BOTICS 특집은 이 풍경 한가운데에서 러너의 시즌을 세 시점으로 나눠 본다. 시즌이 막 시작되기 전, 시즌 한가운데, 시즌이 끝난 뒤.
러너 한 명의 시즌을 펼쳐놓으면?!
러닝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의 러닝 현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본 기자로 예를 들면 대략 이렇다. 평일에는 7~8km 러닝, 인터벌, 근력 보강 및 경사로(Uphill) 등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말에는 18~25km 안팎의 장거리 저속 훈련(LSD)을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10km와 하프(Half)로 알려진 21.0975km 대회를 출전한다. 기자의 하프는 아직 ‘무난한 완주’와 ‘제대로 달린 레이스’ 사이 어딘가에 있다. 스마트 워치 화면에는 최근 4주 주간 거리 그래프와 함께, 최대산소섭취량(VO₂max) 추정치, 임계 페이스, 회복 필요 시간 등 데이터가 숫자로 나열된다.
이 숫자 주변에는 항상 여러 감정과 지속적인 통증이 상존한다. ‘이번 주 인터벌은 3세트째부터 오른쪽 종아리가 당겼다’, ‘어제 계단을 많이 올라갔더니 오늘 무릎이 묵직하다’, ‘컨디션 좋은 날은 5분 초반대 페이스가 편안하게 나온다’ 같은 메모들이다. 러너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만 주고받아도 서로의 수준과 상태를 대략 짐작한다.
여기까지가 러닝씬 안에서 통하는 언어다. 숫자·느낌·기록·통증을 섞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뛰는 사람인지’ 가늠하는 방식. 러너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자기소개가 끝난다.
이 같은 로그를 로봇공학(Robotics)과 피지컬 AI(Physical AI) 관점에서 보는 순간 시각이 달라진다. 관련 연구자가 보는 건 한 사람의 러너가 아니라, 특정 성능을 가진 하나의 동역학(Dynamics) 시스템이다. 인간의 러닝을 분석할 때는 몸무게, 보폭, 케이던스, 지면 접촉 시간, 상·하지 관절 각도 변화 및 회전, 지면 반발력, 충격 파형 등 여러 요소를 본다. 연구단 입장에서, 러너의 페이스와 기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해당 요소들은 특정 실험 조건에서 뽑아낸 출력값에 불과하다.
인간 세계에서는 ‘하프를 2시간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지만, 로봇 분야에서는 질문이 조금 다르다. 이 시스템은 어느 구간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쓰는가, 어떤 스텝에서 불필요한 진동과 충격이 생기는가, 어느 관절에 부하를 몰아서 쓰는가 등을 놓고 검증한다.
로봇이 보는 건 ‘리듬’과 ‘넘어지지 않는 법’

인간 입장에서 보면 러닝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인다. 발을 번갈아 내딛고, 숨을 조절하고, 리듬을 잃지 않는 것.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 사족 보행 로봇 등은 이 장면을 수십 개의 변수로 인식한다. 한 걸음마다 지면과 발 사이에서 오가는 힘, 골반과 상체가 흔들리는 각도, 무릎·발목이 버티는 토크,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과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 비율까지 전부다.
결국 이들 로봇이 러너에게서 배우고 싶은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리듬’, 다른 하나는 ‘넘어지지 않는 법’이다. 리듬은 페이스, 케이던스, 보폭, 상·하체 회전이 만들어내는 패턴이다. 넘어지지 않는 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중심을 다시 찾아오는 능력이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을 연구해 온 김상배 교수는 이런 능력을 두고 ‘피지컬 인텔리전스(Physical Intelligence)’라고 정의한다.
공장 내 로봇이 반복·정밀 작업에 특화돼 있다면, 울퉁불퉁한 지형을 뛰어다니고 충돌에 버티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사람이 하는 많은 물리 작업은 머리로 계산해서 처리하기보다는 몸 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는 영역”이라며, “로봇도 환경과 부딪히는 상호작용을 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MIT 사족 보행 로봇 ‘치타(Cheetah)’는 이러한 주장을 현실로 적용하는 대표 모델이다. 카메라 없이 센서 만으로 계단 위를 오르내리고, 장애물이 흩어져 있는 계단을 밟고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잡아당기거나 밀어도 균형을 다시 찾아낸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쁘게 뛰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몸을 추스르는가’다. 떨어지거나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마다 발을 어디에 어떻게 다시 디딜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이 핵심이라는 말이다.


▲ 기본적으로 로봇은 셀 수 없는 시뮬레이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기능이 최적화·고도화된다. 이를 거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된다. (출처 : MIT)
휴머노이드가 러너의 로그를 읽을 때도 구조는 비슷하다. 평균 페이스나 최고 속도 같은 숫자는 부가 정보에 가깝다. 진짜 관심사는 언제 리듬이 깨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는지다.
예를 들어, 5분 30초 페이스에서 평지는 문제 없지만, 4km 지점 언덕 초입에서 보폭이 갑자기 줄고 케이던스가 들쭉날쭉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하자.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는 바로 그 언덕 구간이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데이터 덩어리다. 러너가 상체를 어떻게 세우고, 발을 어디까지 들어 올리고, 발목을 얼마나 단단히 고정했는지를 배추게 된다. 이때 고속 센싱(High-Speed Sensing)과 모션 캡처(Motion Capture) 등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영역에서는 이 리듬 변화와 위험 구간을 더 세밀하게 본다. 하버드대학교 ‘위스생체모방공학 연구소(Wyss)’의 코너 월시(Conor Walsh) 교수팀이 만든 ‘하체용 소프트 엑소슈트(Lower-Body Soft Exosuit)’가 대표적이다. 이 로봇은 걷기·달리기 상태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춰 구동 타이밍을 바꾸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고정적으로 보행 모드를 세팅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그에 맞게 유연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 속도, 에너지 소비 패턴 등 사용자의 모션을 분석해 지금은 걷는 중인지, 달리기인지를 스스로 감지한다. 이후 그에 맞게 보조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 엑소슈트는 보행과 러닝 두 상태에서 모두 대사 에너지 소모를 눈에 띄게 줄였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이 관점에서 보면, 휴머노이드·웨어러블이 러너에게서 차용하고 싶은 데이터는 명확하다. 리듬이 무너지는 지점, 넘어질 뻔한 순간, 언덕과 내리막, 코너링에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다. 러너는 이것을 단순히 숨차다, 힘들다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로봇은 그 순간들을 통째로 센서 데이터, 관절 각도, 지면 반력 그래프 등으로 데이터화한다. 이처럼 휴머노이드, 사족 보행 로봇, 웨어러블에게 러닝 로그는 ‘얼마나 빨랐는지’보다 ‘어떻게 버텼는지’를 가르쳐 주는 정석책이다.
웨어러블 로봇은 ‘언제 도와줘야 하는가’의 지점을 찾는다
사람 다리에 모터(Motor)와 연결부(Link)를 둘러 씌운 하체형 웨어러블 로봇은 본질적으로 타이밍의 장치다. 언제, 어디를, 얼마나 도와줘야 할지 결정하는 기계다.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에 토크를 실어 평지를 더 쉽게 달리게 만들 수도 있고, 오르막에서 체중 일부를 대신 들어줘 심폐 부담과 관절 스트레스를 낮출 수도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체형 웨어러블까지 더해지고 있다. 어깨·팔·허리 주변을 감싸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들이다. 공장·물류 현장에서는 박스를 수백 번 들어 올리는 작업자들을 위해 상체·허리형 웨어러블이 이미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 장치들은 ‘얼마나 무거운 걸 드는가’보다 ‘하루 종일 어떤 자세와 리듬으로 버티는가’, ‘허리와 어깨에 누적되는 토크를 어떻게 나눠 갖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
특히 상체형 웨어러블 로봇은 언뜻 보기에 러닝과 연관성이 적어보인다. 하지만 몸 전체의 메커니즘으로 시각을 달리하면 연결 고리가 생긴다. 러너에게 상체는 단순히 팔을 휘두르는 부속품이 아니다. 언덕에서 상체를 어떻게 세우는지, 스퍼트 할 때 팔치기를 얼마나 과하게 가져가는지, 장거리 후반에 허리가 얼마나 무너지는지가 모두 러닝 효율(Running Economy)과 부상 위험의 가능성을 좌우한다.
상체형 웨어러블이 축적하는 데이터도 결국 이 지점이다. 언제 허리가 주저앉으려 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는지, 팔치기가 리듬을 살리는 방향인지, 오히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쪽인지 등이다.

실제로 인간의 러닝 로그에는 하체 데이터가 상체 영역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심박, 페이스, 케이던스 패턴만으로도 상체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도 적지 않다. 언덕에서 갑자기 심박이 튀고 페이스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반복되는 구간을 꼽을 수 있다. 또 장거리 후반에 다리보다는 어깨·목·허리가 먼저 뻐근해지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현실에서 상체형 웨어러블과 하체형 웨어러블이 같은 러너의 로그를 참작한다고 가정할 때,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데이터를 나눠 맡게 될 것이다. 상체형은 허리와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세와 토크를 받친다. 하체는 다리를 조금 더 밀어주는 식이 된다.
예컨대 인터벌에서 갑자기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순간, 언덕 초입에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상태, 후반에 종아리와 무릎이 과부하를 느끼는 상황 등이 모두 연속 데이터로 남는다. 각 로봇 폼펙터는 이를 자신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은 이러한 패턴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운다. ‘도와줘야 할 때’와 ‘참고 기다려야 할 때’. 이때 본 기자의 훈련 사례를 토대로 가정해보자. 평지에서는 페이스와 케이던스가 안정적인데, 특정 경사 이상의 언덕만 만나면 케이던스가 흐트러지고 지면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여기에 심박이 급격히 치솟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웨어러블 로봇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개입 포인트’로 표시된다. 언덕 시작 몇 초 전부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조금 더 토크를 실어주고, 상체가 과하게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허리·코어 주변을 받쳐 주는 식의 전략을 취할 수 있다.
반대로, 기자가 오늘 컨디션 좋았다고 느끼는 날의 로그를 보면 페이스, 심박, 케이던스, 수직 진동 등이 모두 안정적이다. 웨어러블 로봇이 여기서 과하게 지원하면 기자의 훈련 루틴은 오히려 리듬이 깨진다. 이 과정에서 러닝 로그를 많이 학습한 웨어러블일수록 건드리지 말아야 할 순간을 더 정확히 구분하게 된다. 러너가 체감하는 ‘오늘은 그냥 두는 게 제일 큰 도움’이라는 감각을 데이터로 학습하는 셈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빠른 미래에 상·하체 웨어러블과 스마트 워치가 한 생태계 안에서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특정 패턴이 감지될 때 워치가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다.

“오늘은 오른쪽 하체 부하가 지난주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언덕 구간에서 상체 무너지는 패턴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인터벌 대신 이지 런으로 바꾸는 걸 추천해요”라고. 이 추천을 웨어러블 로봇이 적재적소에 구현하는 것은 지금의 스마트 워치 속 ‘AI 코치’ 기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짜 피지컬 AI’ 코치다.
이번 1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하다. 러너가 시즌을 시작할 때 목표 기록과 대회 일정만 정해두는 대신, 지난 시즌 로그를 한 번쯤 ‘로봇이 탐낼 만한 데이터 셋’이라는 전제로 다시 들여다보자는 것.
그리고 내 러닝 로그 안에서 휴머노이드가 주목할 리듬, 웨어러블이 주목할 개입 타이밍을 골라 보는 상황. 그 작업을 한 번만 거쳐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힘을 과하게 쓰고 있고, 어디를 너무 오래 방치해 왔는지가 훨씬 또렷해진다.
최근 한국에서 불고 있는 러닝 붐에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끌어들이는 일은 거창한 첨단 기술의 메시지가 아니다. 시즌의 출발점을 ‘기록’이 아니라, 내 워치 속 숫자를 로봇이 배우고 싶어 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것을 주요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