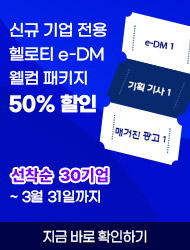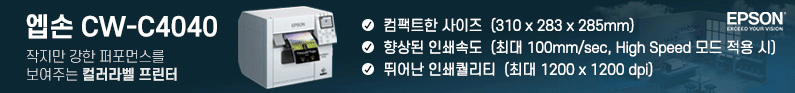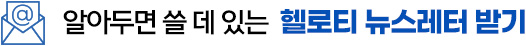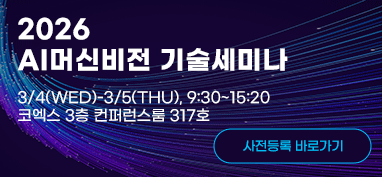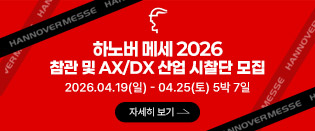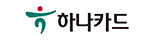2025년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의 밤을 뚫고 누리호 4호기가 K-우주 독립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예정된 시각보다 18분 늦춰진 발사. 지난 2021년 1차 발사부터 이어진 로켓 한 발의 발사였지만, 최초의 민간 주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우주 산업 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한국형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이다.
이번 4차 발사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이른바 ‘누리호고도화사업’ 흐름 위에서 출발했다. 이 사업은 누리호 4기를 반복 제작·발사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쌓아온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민간 체계종합기업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조립·발사운영 등 전반을 총괄했다. 회사는 지난 7월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설계·제작·발사운영 등 전 주기 기술을 이전받아 2032년까지 직접 제작·발사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했다. 이번 발사는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민간 로켓 공장과 발사팀의 손으로 넘어간 첫 실전 무대로 꾸며졌다.
이번 네 번째 비행은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우주를 정의하고, 어떻게 세계관을 확장하는지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 청사진의 중심에는 공장, 발사대, 궤도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 13대가 함께 들어 있다.
‘왜 우주에 로켓을 쏴야 할까’, ‘왜 그 역할이 한국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힌트도 이 안에 숨어 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발사 전 준비 과정부터 궤도에서의 임무, 앞으로 열릴 다음 단계를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따라가 본다.
카운트다운 이전의 카운트다운, 로봇이 만든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 이야기는 대부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실제로 누리호의 출발점은 훨씬 일찍,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공장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곳은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드는 전용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다. 누리호의 심장에 해당하는 75톤급 엔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약 2400개 부품이 458개 공정을 거쳐야 했다. 조립동 안에서는 용접 로봇과 연마 로봇이 정해진 공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자동화된 공정 옆에서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조립을 다듬는 구조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각종 자재를 나르는 무인운반차(AGV)(좌)와 다양한 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우). (출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의 추진계는 ▲1단 75톤급 엔진 네 기 ▲2단 75톤급 엔진 한 기 ▲3단 7톤급 엔진 한 기 이렇게 배치된 구조다. 이 여섯 기 엔진 모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 만들었다. 작업자의 손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양과 정밀도다. 다시 말해, 결국 발사 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기술은 발사대가 아니라 이 공장 안의 로봇들이었다. 엔진 부품을 옮기는 무인 운반 장비와 용접·연마 로봇이 엔진 심장을 만들고 넘겨준 뒤에서야,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의 시간이 시작됐다.
발사 이틀 전, 완성된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 발사체 종합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했다. 이때 쓰인 수단이 무인 특수이동 차량, 일종의 초대형 트랜스포터(Transporter)다. 발사체는 작업자 없이 이 차량 위에 실린 채 약 1시간 10분 동안 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1.8km 남짓을 이동했다.
이후 발사대에 도착해 기립 작업이 이뤄졌고, 엄빌리컬(Umbilical)을 통해 전원과 추진제를 공급할 준비가 진행됐다. 엄빌리컬은 발사체와 지상 설비를 잠시 연결해 전력·연료·냉각·데이터를 주고받는 동력 핵심 장치로, 이륙 직전에 자동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기밀 점검과 각종 계측 장비 상태 확인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고층풍·우주환경 등을 분석한 후 발사 시각을 확정했다. 준비 과정의 앞머리는 공장 안 로봇이, 뒷머리는 트랜스포터 및 자동화 설비가 나눠 맡은 셈이다.
누리호는 이륙 후 약 21분 24초 동안 비행하면서 발사체 1·2단, 위성 덮개(Payload Fairing)를 차례대로 분리한 뒤 고도 약 600km에서 위성들을 사출했다. 비행 13분 27초 지점에서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먼저 궤도로 나갔고, 이어서 ‘부탑재위성(이하 큐브위성)’ 12기가 약 20초 안팎 간격으로 둘씩 짝을 지어 우주로 흩어졌다.
13분에 임무 개시한 ‘우주 13특임대’...우주의학부터 군집 비행까지
이 시점부터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로봇들의 시간이다. 이번 4차 비행에는 약 500kg급 차세대중형위성 3호 한 대와 초소형 큐브위성 12대, 총 13기가 탑재됐다. 주탑재체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고도 약 600km 태양동기궤도에서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한다.
이 위성은 우주 환경과 우주 의학 연구를 동시에 수행한다. 오로라·대기광을 포착하는 광시야 카메라, 전리권 플라즈마와 자기장 변화를 재는 계측기가 주요 임무를 맡았다. 특히 줄기세포를 자동 배양하고 3D 프린팅하는 바이오 캐비닛까지 탑재해 국내 위성 최초로 우주의학 실증에 나섰다.
이 조합은 태양 입자 에너지의 대기권 교란 효과와 위성 통신, GPS 정확도 변화를 동시에 분석한다. 미세 중력에서의 세포 분화 연구도 포함된다. 결국 국내 위성 중 처음으로 우주의학 실증에 나선 종합 실험 플랫폼인 것이다.

특히 누리호에 탑재된 큐브위성 12대는 쉽게 생각하면 로봇으로 활동하게 된다. 몸집은 일반 위성보다 작지만 역할은 분명하다. 이들은 가로·세로·높이 10cm의 정육면체를 기본 단위로 쓰는 초소형 위성 규격이다. 이 정육면체 하나가 일종의 블록이고, 여러 개를 세로로 붙여 3유·6유 등 형태를 만든다.
이 안에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소형 컴퓨터, 자세 제어 센서, 반작용휠, 지상·우주 간 통신 안테나, 각종 실험 장비 등이 들어간다. 스마트폰 한 대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화면, 카메라, 통신 모듈, 각종 센서, 연산 장치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큐브위성도 손바닥보다 조금 큰 몸 안에 자율 로봇 한 대를 통째로 넣어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올라간 큐브위성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는 로봇 팀에 가깝다. 일부 위성은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단백질을 우주에서 결정화해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우주 의사 역할을 맡는다.
또 다른 위성들은 해양에 띄운 부이와 통신하며 저궤도에서 센서 데이터를 받아 내려보내는 통신 실험을 수행하고, 차세대 통신 규격과 인공지능(AI) 기반 지상국 운영 방식을 시험한다.

임무가 끝난 뒤에는 스스로 추력기를 이용해 궤도를 낮추고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자기 폐기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위성도 있다. 또한 국산 부품과 반도체를 싣고 몇 년 동안 방사선과 극한 온도에 노출되면서 성능과 수명을 확인하는 품질검사 위성, 말려 있던 롤러블(Rollable) 태양전지를 우주에서 펼쳐보는 태양전지 실험 위성도 포함돼 있다.
가장 극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두 대의 큐브가 한 몸으로 올라갔다가 궤도에서 다시 갈라지는 쌍둥이 위성이다. 이 쌍은 GPS와 센서 정보만으로 상대 위치를 추정하면서 일정 간격을 유지해 편대비행을 하고, 이후에는 자력·자석을 이용해 다시 만나 도킹을 시도하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대형 추진기가 없는 초소형 몸체로 이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쌍둥이 위성은 드론에서 주로 구현되는 '군집 운용(Swarm Operation)' 개념을 우주 궤도에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궤도상 도킹 기술을 실제 궤도 위에서 검증하는 실험 또한 향후 우주 로봇 시스템을 위한 핵심적인 실증 무대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큐브위성은 ▲우주 의사 ▲환경 감시자 ▲통신 중계기 ▲부품 시험 기사 ▲태양전지 실험자 ▲도킹 연습생 등으로 구성된 12대 로봇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히 위성 13기를 올린 발사가 아니다. 큰 위성 하나에 모든 실험을 몰아 넣는 대신, 여러 대의 작은 위성에 나눠 싣고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빠르게 회수하는 구조다. 한국 우주개발이 우주 실험 플랫폼 단계로 올라섰다는 표현이 붙는 이유다.
결국 ‘왜 우주에 로켓을 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여기서 구체적인 답을 얻는다. 통신·위성항법·기상·재난 등을 다루는 기본 인프라는 물론, 우주 궤도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자 데이터 센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한국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런 우주 인프라와 실험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쥐고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완의 공백을 메워라...로봇이 채울 미래 우주 개척 영역
정리하면, 로봇의 무대는 크게 둘이다. 지상에서 로켓과 위성을 찍어내는 공장, 그리고 궤도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공간이다. 지상에서는 이미 로켓·위성 제조 공정에 로봇이 깊게 관여한다. 액체 엔진, 탱크, 위성 구조체를 반복해서 찍어내는 공장일수록 이러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비전 검사 시스템 등이 대거 활용된다. 누리호급 발사체와 중소형 위성을 정기적으로 쏘려면, 이런 로봇 공장이 사실상 K-우주 생산 인프라가 된다.
반면 발사·회수 인프라에서 로봇은 아직 절반쯤만 들어와 있다. 한국 발사장 기준으로는 트랜스포터, 고정식 자동화 설비 등이 발사 전후를 책임지고 있다. 위험 구역 점검용 이동 로봇은 본격 도입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업체 스페이스X(SpaceX)가 해상 드론십에서 로켓 1단을 고정하는 전용 로봇 ‘옥타그래버(Octagrabber)’를 운용하는 정도다. 착륙한 부스터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 선박 이동과 파도에 버티도록 붙잡아 주는 장치로, 발사·회수 사이 공정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수행하는 모습을 구현한 첫 사례에 가깝다.
이 흐름이 확장되면 발사대 주변 잔여 연료 및 가스 누출 감시 로봇, 파편 원격 감지용 자율주행로봇(AMR) 플랫폼 등이 도입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는 발사 준비와 복구 과정 사이에 남아있던 로봇 공백을 해소하며, 차세대 로봇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줄 것이다.

우주 궤도 안에서는 로봇 활용도가 비교적 활발하다. 수리, 연료 보급, 퇴역 처리 등을 수행하는 궤도상 서비스(In-orbit Service)는 이미 미국·유럽·일본에서 실증이 진행 중이다. 우주망원경, 태양광 발전소, 통신 위성 군집을 궤도에서 조립·점검하는 로봇 팔(Robot Arm)과 궤도 안에서 자유롭게 가동하는 이동 로봇에 대한 구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방위 기술 업체 노스럽그루먼(Northrop Grumma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회사 스페이스로지스틱스(SpaceLogistics)는 위성의 수명을 연장하는 궤도상 서비스 차량 ‘미션 익스텐션 비히클(MEV)’를 개발했다.
해당 기체는 위성 통신 서비스 업체 인텔샛(Intelsat)의 901호, 10-02호와 연이어 도킹하며 궤도를 수정, 위성 수명을 각각 5년씩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상업용 궤도상 서비스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캐나다가 개발한 로봇 팔 ‘캐나다암2(Canadarm2)’이 모듈 조립, 화물선 캡처, 외부 설비 교체를 맡아 사실상 궤도상 정비 로봇 역할을 해왔다.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대형 우주망원경, 우주 태양광 발전소, 통신 위성 군집을 궤도에서 조립·점검하는 로봇 팔과 이동 로봇 구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누리호 4호에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대가 맡은 통신·전력·도킹·부품 관련 실험은 우주 로봇이 실제로 움직일 무대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뉴 스페이스(New Space) 흐름을 보면 이러한 방향성은 더욱 명확하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X·블루오리진·ULA(United Launch Alliance) 등 민간 기업이 우주선 발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정부는 자체 발사체 개발 대신 발사를 서비스로 쓰는 구조로 옮겨가는 중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과 이번 첫 민간 주도 발사는, 한국도 같은 룰을 적용한 경쟁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초 21분 24초로 설계된 비행은 엔진 출력 여유 덕분에 18분 25초 만에 끝났다. 엔진 1·2·3단 분리, 위성 덮개(Payload Fairing) 분리, 위성 13기 내보내기, 초기 교신까지 계획한 절차와 임무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사체 소유 여부가 아닌, 지상·우주를 로봇으로 완벽히 연결하는 새로운 우주 강국의 비전. 누리호 4호는 그 문장을 채울 첫 번째 키워드를 던졌다. 이제 K-우주는 로봇과 함께 다음 세기로 비상할 채비를 마쳤다. 로봇 기반 우주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됐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