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시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느냐”는 반발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주택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귀결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와 기대가 움직이는 생물이다.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단번에 통제되거나,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가격이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늘 우회로를 찾고, 통제의 강도가 높을수록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했다. 가격은 잠시 멈췄지만,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은 줄었으며, 결국 시장은 더 불안정해졌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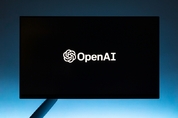
전문가들, 오픈AI 사태에 "생성형 AI 포함한 AI 규제 주도해야 하는 이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해임 드라마가 6일 만에 올트먼의 CEO 복귀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태로 AI 업계 지배구조 등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픈AI 같은 기업이 AI의 안전 문제를 자율 규제로 풀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위태로워지면서 각국 정부가 AI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22일(현지시간) 올트먼의 CEO 복귀와 그를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 재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 지분 49%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원으로 올트먼이 돌아오고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와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이 이사진에 가세, 이번 사태는 사실상 MS의 승리로 끝났다.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그간 올트먼은 비영리 법인 산하에 영리사업 부문이 소속돼 있는 오픈AI의 특이한 기업 구조가 강력한 AI의 무책임한 개발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설명해왔다. 만약 오픈AI의 이사회가 보기에 올트먼 자신이 위험하거나 인류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자신을 쫓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