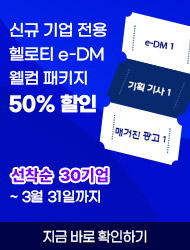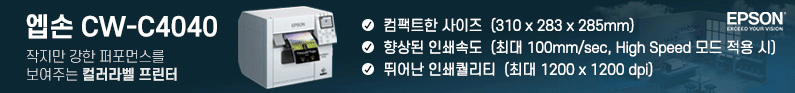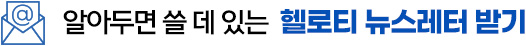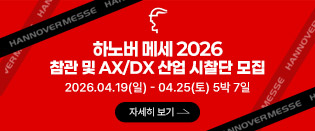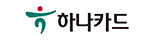부동산 실물자산(RWA) 토큰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다. 특히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는 모든 글로벌 플랫폼이 주목하는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아시아를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 아시아는 언어·문화·규제가 얽힌 복잡한 모자이크다. 성공의 열쇠는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각 시장의 결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초현지화(Hyper-localization)’에 있다.
첫째, ‘문화적 서사’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같은 RWA 상품이라도 어떤 가치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수용도는 극명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베트남처럼 커뮤니티 문화가 강하고 가상자산 채택률이 높은 시장에서는 ‘다 함께 참여하는 바이럴 성장’ 서사가 효과적이다. 페이스북·Zalo 등 현지 소셜 플랫폼 중심의 친구 초대 이벤트와 게임화된 챌린지를 통해 풀뿌리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신뢰’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지 기업 및 협회와의 파트너십으로 신뢰를 선(先)축적하고, 자산 안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육 콘텐츠로 보수적 투자 성향을 공략해야 한다. 한국은 제도권 친화적 서사가 설득력이 높다. 공시·리스크 관리·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체계를 전면에 제시해 ‘검증 가능한 실체’를 강조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둘째, ‘규제 환경’의 현지화는 생존의 문제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는 디지털 자산을 금융규율 틀 안에서 다루는 사례가 보고되어 규제 적합성 검토가 의사결정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태국은 시기별 세제·면허 정책 변화가 시장 메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규제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제공’ 중심으로 톤을 조절하고, 미국 등 투자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IP 차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는 다수의 글로벌 DeFi 프로토콜이 준법을 위해 채택하는 일반적 방식이다. 실제 론칭 전에는 반드시 해당국 최신 가이드라인과 라이선스 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 ‘채널 및 파트너’의 현지화가 실행력을 좌우한다.
전역형 인플루언서 한 명보다 각국에서 신뢰받는 마이크로 KOL 다수가 실제 전환에 더 효과적이다. 국가별 대표 미디어와의 협력은 필수이며, 현지 VC(벤처캐피탈)나 마케팅 에이전시와의 파트너십은 시장 진입 속도를 가속화한다.
이러한 초현지화 전략은 이미 다른 산업에서도 증명됐다. 넷플릭스는 단순 번역을 넘어 각국의 문화 코드를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오징어 게임’, ‘킹덤’ 등)로 글로벌 성공을 이끌었다. 에어비앤비는 각국의 여행 트렌드와 숙소 문화를 반영한 ‘현지 호스트와의 교류’를 강조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RWA 시장의 성공은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각 시장의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고, 규제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현지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초현지화’ 전략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