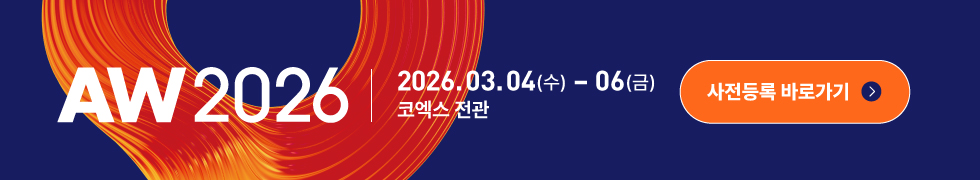지난해 중국계 완성차 브랜드의 글로벌 점유율이 신흥국 및 전기차 시장 공략에 힘입어 20%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국 자동차 글로벌 진출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완성차 업계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 및 생산 거점을 넓히며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22.0%를 기록했다.
중국계 브랜드는 거대 내수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며 성장 기반을 확보했고, 내수 경쟁 심화와 과잉 생산능력 해소를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 중이다.
권역별로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아세안, 중동 등 신흥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유럽 선진시장에서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러시아·CIS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철수하자 중국계 브랜드들이 이 공백을 메우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다만 러시아 정부의 재활용(폐차) 수수료 및 수입 관세 인상, 현지 부품 사용 비율 의무화 등으로 추가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중국계 브랜드는 중남미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현지 조립·생산을 통해 공급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을 내세우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관세, 보조금 축소 등 제약에도 전기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중국계 브랜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계 점유율 확대가 두드러진다.
올해 3분기 기준 중남미 전기동력차 판매의 88.2%를 중국계 브랜드가 차지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중국계가 사실상 현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유럽 28개국의 중국계 전기동력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고, 제 투어 등의 신규 진입과 BYD(비야디) 현지 생산 등으로 판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중국 자동차의 글로벌 판매 확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현지 대응력 제고와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신흥국에서 중국계의 급부상으로 한국계의 입지 약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 간 적극적인 통상 대화를 통한 현지 대응력 제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3분기 대미 자동차 수출은 6.6% 감소했으나 유럽, 남미, 아프리카 증가분이 감소세를 완화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 중국계와의 경합 가능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샤오미·화웨이 등 IT 기업 가세로 중국 내수 경쟁은 기술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이러한 양상이 해외로 확대될 시 국내 기업 주도권 확보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