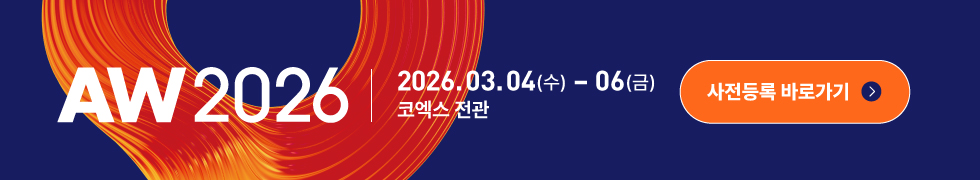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러닝 전국시대’다. 주말마다 도심 속 도로가 통제되고, 번호표 단 러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는 통계만 봐도 금세 체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24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민이 1년간 참여 경험이 있는 체육 활동 가운데 ‘달리기’ 비중이 기존 0.5%에서 6.8%까지 상승했다. 이 가운데 주 1회 이상 조깅을 하는 사람만 약 3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업계와 마케팅 보고서에서는 국내 러닝 인구 전체를 2017년 500만 명 안팎에서, 100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는 지표까지 나온다. 국회 자료를 정리한 마라톤 매체는 국내 마라톤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19회 수준에서, 2023년에는 200여 회로 급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참가자 수도 1만 명이 채 안 되던 상황에서, 지금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시장으로 커졌다. 서울 도심을 통째로 막아 4만 명 가까운 러너가 동시에 뛰는 장면도 이제는 뉴스라기보다 계절 풍경에 가깝다.
러닝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지금 좀 뛰는 사람들은 ‘운동 좀 해야지’ 수준을 넘어서, 시즌마다 목표 대회를 찍고 스마트 워치로 각종 지표를 관리한다. 시간당 거리를 뜻하는 페이스(Pace)부터 분당 발구름 수치인 케이던스(Cadence), 심박 수 등을 분석하며, 이전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러닝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러한 정보가 한데 집약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숫자로 비교하기도 한다.
이들은 퇴근 후 집 앞 코스를 한 바퀴 도는 생활 러너부터, 해외 메이저 대회를 버킷리스트에 올린 마스터스 러너까지 다양하다. 현시점 우리나라에서의 러닝은 장비·데이터·커뮤니티가 엮인 ‘프로젝트형 취미’에 가까워지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 판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 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손목 위 작은 컴퓨터인 스마트 워치부터 대회 코스 곳곳에 배치된 계측기기 등 각종 장비가 러너를 지원한다. 해당 기술은 숨·심장을 초 단위로 기록하고, 수천 명의 랩 타임(Lap Time)과 영상을 동시에 수집해 서버로 보낸다. 또한 러닝화 한 켤레 뒤에는 실험실과 테스트 장비, 밑창을 수십만 번 두드리는 로봇·자동화 설비들이 있다. 레이스가 끝난 뒤에는 지친 몸을 다시 세우는 재활실에는 각종 로봇과 기계 장치가 돌아가고 있다.
이번 RUN+BOTICS 특집은 이 풍경 한가운데에서 러너의 시즌을 세 시점으로 나눠 본다. 시즌이 막 시작되기 전, 시즌 한가운데, 시즌이 끝난 뒤.
‘장비빨’ 뒤에 숨은 공학, 러닝화 속 ‘테스트 로보틱스’의 비밀
요즘 러너들 사이에서는 ‘먼저 열리는 건 다리 관절이 아니라 지갑’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한다. 시즌을 준비한다는 말은 곧 러닝화를 새롭게 장만하고, 새 스마트 워치를 손목에 들이고, 양말·벨트·조끼까지 ‘세팅’을 맞춘다는 뜻이다. 일명 장비에 진심인 러너들, 이른바 ‘장비빨’ 밈이 웃음거리처럼 소비되는 이유다.

이때 정작 우리가 발에 신는 그 한 켤레 러닝화는 이미 인간 대신 수십만 번 먼저 뛰어 본 신발이다. 러너가 클릭 몇 번으로 러닝화를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어느 실험실 안에서는 러닝화만을 위해 설계된 테스트 로봇·기계들이 먼저 코스를 돌고 있다.
그 로봇들이 쌓아 올린 데이터가 착지 순간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덜어내고, 종아리·발목에 실리는 부하를 조정한다. 대회 속 막판 1km에서 한 번 더 딛고 나갈 반발력을 세팅하기도 한다. 러너 입장에서 ‘이 신발 나랑 잘 맞는다’는 감각은 결국, 어딘가에서 로봇이 미리 몇 천 km를 뛰어준 결과가 압축된 것이다. 이 장치들은 신발의 성능을 정교한 공학적 데이터로 추출하기 위해 인간 착지 패턴을 모사한 기계식 다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신발 밑창부터 지면, 카메라와 센서까지. 결국 ‘내 발 하나’라고 생각했던 러닝 동작은 생각보다 많은 기계와 로봇을 거쳐 최적화(Tuning)된 결과물이다. 러닝화를 고를 때 러너는 보통 쿠션·반발력·민첩함 같은 감각적인 느낌을 우선한다. 이를 기반으로 쿠션화·안정화·카본화 등 러닝 용도와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신발을 찾는다.
하지만 브랜드 연구개발(R&D) 센터 입장에서 러닝화는 훨씬 더 공학적인 대상이다. 에너지 리턴율, 쿠션 압축·복원 속도 및 수준, 특정 속도에서의 변형률, 기온과 습도에 따른 거동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인간 발로는 이것을 끝까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러너가 하루에 2만 보를 뛰어도, 신발은 수십·수백만 회의 착지를 버텨야 한다. 그래서 신발 대신 먼저 뛰는 로봇·기계들이 동원되는 것이다. 하나의 로봇 다리가 올라가 있고, 그 아래에 러닝화가 끼워진 테스트 장비를 떠올리면 된다.
‘움직임 구현은 자동으로, 감각은 숫자로’...로보틱스가 설계하는 당신의 레이스
이러한 장치는 서보 모터(Servo Motor), 실린더, 압력 센서 등이 기본 탑재된다. 설정해 둔 속도와 힘에 맞춰 같은 자리에 끊임없이 자극을 가한다. 좀 더 고도화된 로봇·기계는 설정 값을 유연하게 바꿔가며 러너들의 레이싱 특성에 맞게 테스트를 진행한다. 평지 착지 상황뿐만 아니라, 힐 스트라이크,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 등 러너의 다양한 착지 타입을 재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장비는 지면 각도를 주기적으로 바꿔 오르막·내리막 상황까지 흉내 낸다.
글로벌 브랜드의 R&D 센터들에서 이 같은 장면을 볼 수 있다. 나이키 스포츠 리서치 랩(Nike Sport Research Lab)에서는 트레드밀과 연동된 기계식 다리가 특정 패턴으로 수십만 회 착지한다. 이로써 미드솔 압축·복원 데이터를 쌓고, 기압·온도·습도를 바꾼 제어실(Chamber) 안에서 같은 테스트를 반복한다.

아식스 스포츠공학연구소(ASICS Institute of Sport Science)는 실제 러너의 보행·주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기계식 다리와 충격 시험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속도, 착지 위치, 각도에 따라 밑창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정량화한다.
아디다스(Adidas)의 러닝 연구 시설에서도 신발에 이식되는 카본 플레이트(Carbon Plate)의 탄성을 검증한다. 또한 폼(Foam) 층 두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곡선을 뽑아낸다. 이때 로봇 발(Mock-up Foot)과 반복 충격 시험기를 이용한다.
이 같은 로봇·기계는 러너가 느끼기에 ‘약간 말랑하다’, ‘반발이 좋다’로 끝나는 감각을 실제 데이터로 내놓는다. ‘몇 뉴턴으로 얼마 동안 눌렀을 때 몇 퍼센트만큼 복원했다’라는 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테스트 장비들이 단순히 신발이 닳을 때까지 검증하는 기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러너의 시즌을 미리 내다보는 시뮬레이터에 가깝다. 러너가 실제로 뛰기 전에, 비슷한 패턴의 하중을 신발에 걸어 보고 어떤 속도·거리에서 성능이 무너지는지 미리 확인하는 역할이다. 러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10km를 한 번 뛸 동안, 어딘가의 실험실에서는 내 신발과 비슷한 샘플이 몇 천 km를 이미 대신 뛰어본 상황이다.
테스트 장비가 다리 수준의 차원을 넘어, 인간 몸 전체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도 최근 등장했다.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이 신발을 신고 테스트하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Beijing Humanoid Robot Innovation Center)’와 스포츠 용품 업체 ‘리닝(Li-Ning)’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포츠 과학 공동 연구실(Humanoid Robot Sports Science Joint Laboratory)’을 공개했다.
이 연구실은 혁신센터의 순수 전기 구동 휴머노이드 로봇 ‘톈궁(Tiangong)’을 활용해 스포츠 과학 데이터 수집·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톈궁은 리닝 ‘레드 래빗 8 PRO(Red Rabbit 8 PRO)’ 러닝화를 신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중이다. 연구실 관계자는 “고강도 반복 테스트와 러닝 자세 감지 등을 휴머노이드 기반 데이터로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톈궁 울트라(Tiangong Ultra)’는 지난 4월(현지시간) 베이징 이좡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에서 21.0975km를 2시간 40분 42초에 주파하며 로보틱스 부분을 석권했다.
이렇게 러너의 복잡한 주행 패턴을 로봇이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휴머노이드는 러닝화 성능을 정량화하는 ‘시뮬레이션 주체’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인간의 움직임을 모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강도 반복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된 셈이다.
로봇·기계가 찾아내는 러닝의 임계점...각종 변수를 복제하는 기술은?
신발 테스트만 로봇·기계에 맡기는 것도 아니다. 러닝 과정에서의 전체 동작과 메커니즘을 테스트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계측형 트레드밀과 지면 반력 플랫폼이다. 보기에는 일반 러닝머신과 비슷하지만, 벨트 아래에 힘 센서(Force Sensor)와 하중 정밀 측정을 위한 로드셀(Load-cell)이 촘촘히 이식돼 있다.
로봇에는 모터·실린더 등이 탑재된다. 모터는 로봇에 설정된 속도 대비 페이스를 여러 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움직임을 탐색한다. 어느 구간에서 자세가 무너지는지, 발목과 무릎이 받는 토크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테스트하는 식이다.
실린더가 달린 장비는 인위적으로 충격 이벤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트레드밀의 특정 구간에만 살짝 더 단단한 블록을 심어둔다거나, 미세한 경사 변화를 준다. 로봇과 계측 장비 입장에서는 몸이 그 순간 어떻게 대응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이다. 테스트 루틴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 실제 러너의 특정 러닝 로그를 불러와 ‘이 패턴대로 뛴다고 가정하고 신발과 지면의 데이터를 쌓아봐라’라고 던져주는 방식이다.

이들 장비들은 신발과 지면을 상대로 무한 반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록 향상도 중요하지만, 언제 밑창이 꺼지고, 어떤 속도에서 충격이 관절 한 군데로 몰리는지 가시화해 주는 도구로 활약하는 중이다. 러너가 느끼는 ‘이 구간만 오면 유독 힘들다’는 감각이, 실험실 안에서는 ‘이 속도·기울기에서 수직 지면 반력(GRF)이 피크를 찍는다’는 그래프로 바뀐다. 이를 기반으로 현시점 러닝화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행을 보조하는 ‘스마트 피팅’ 기술이 뜬다...착용감부터 동력 전달까지
시즌 한복판의 러닝은 코스 위에서도 로봇·기계와 함께 펼쳐진다. 칩 계측과 코스 주변 카메라·짐벌 등 장비들이 ‘현장 자동화’라면, 가까운 미래에는 러닝화가 더 이상 수동 장비에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선 테스트 로봇·기계가 맡던 ‘반복·피팅·조정’의 역할을 신발이 일부 흡수하는 방향이다. 신발 자체가 센서와 구동으로 착용감을 관리하는 ‘작은 웨어러블 로봇’로 진화하는 그림이 업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이키는 센서가 착화를 감지하면 내부 모터가 끈을 자동으로 조여 주는 형태의 ‘셀프 레이싱(Self-lacing)’ 콘셉트를 공개한 바 있다. 착화 순간 최적의 맞춤새를 제공하고, 신발 자체의 버튼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임 강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끈을 묶는다’는 행위를 자동화로 치환한 셈이다. 발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유격을 줄이고 러너가 느끼는 착화감의 흔들림을 데이터와 구동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푸마도 비슷한 방향에서 ‘Fi(Fit 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모터와 케이블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피팅 신발을 공개했다. 신발이 스스로 조여지고 풀리는 구조를 전제로, 손목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해 상황에 따라 핏을 바꾸는 콘셉트다.

이는 러너의 퍼포먼스를 제고하기 보다, 신발의 피팅 자체를 기계·제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이 흐름은 러닝화가 더 이상 폼과 플레이트만의 싸움이 아니라, 센서·구동·제어까지 흡수해 가는 방향을 보여준다.
나이키는 러너의 발에 로봇을 얹는 발상도 현실화했다. 최근 공개한 ‘프로젝트 앰플리파이(Project Amplify)’는 러닝화 바깥쪽과 발목 근처 부위에 배터리·모터를 탑재한 커프(Cuff)를 두는 형태다. 구동력을 신발과 연결하는 신발 위에 얹는 보조 장치 형태의 ‘동력 보조 풋웨어 시스템(Powered Footwear System)’이다.
이 기술 메커니즘은 걷기·달리기에서 추진력을 조금씩 보태는 ‘인체용 e-바이크와 같이(Like an e-bike for the human body)’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이키 측에 따르면, 400명 이상이 참여한 테스트에서 240만 걸음 이상의 데이터를 쌓았고 9개 버전으로 반복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키는 웨어러블 로봇 업체 데피(Dephy)와의 기술 협업도 밝혔다. 보행·주행 시 하체 관절에 토크를 더해 에너지 부담을 낮추려는 양사의 공감에 의한 파트너십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프로토타입 성격이 강하지만, 러닝 생태계가 ‘움직임을 보조하는 기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들은 대중적 페이스대인 1마일당 10~12분의 러너를 포함해, 더 넓은 소비자층으로 확장한다는 출시 방향성을 제시했다.


▲ 나이키 프로젝트 앰플리파이(좌)와 데피 웨어러블 로봇(우). (출처 : 나이키·데피, 편집 : 헬로티 최재규 기자)
이 모든 장면을 통틀어 보면, 시즌 한복판의 러닝은 더 이상 사람이 뛰고 기계는 기록만 한다 수준이 아니다. 러닝화는 이미 로봇·기계에게 수십만 번의 테스트를 거친 뒤 러너 발을 만난다. 러너가 트레드밀 위에서 폼 교정을 받을 때는, 모터와 센서로 무장한 계측 장비가 발 아래 지면을 대신한다.
러너에게 ‘시즌 중’이란 그저 즐겁게 땀 흘리며 달리는 시간이겠지만, 그 이면의 기술 세계를 들여다보면 결코 인간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다. 러너가 대회 신청 버튼을 누르고 출발선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 러너가 코스를 질주하는 그 모든 찰나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뛰고 있는 것은 결국 로봇·기계들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