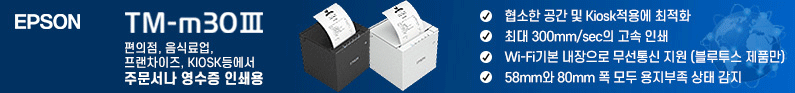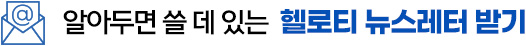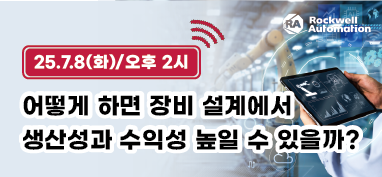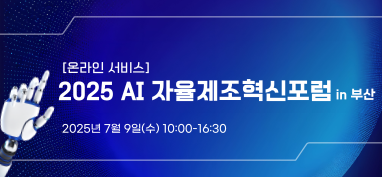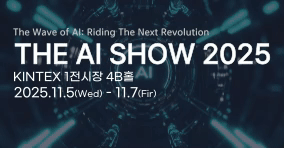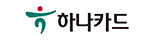[첨단 헬로티]
베트남은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를 입은 아시아 국가 증 하나로 불리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은 베트남을 생산 선호기지로 삼아왔다.
CNBC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져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필요했다. 상당수 기업과 전문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베트남을 꼽는 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일본 은행 ‘노무라(Nomura)의 선임 경제학자 유벤 파라쿠엘레스(Euben Paracuelles)는 지난 달 CNBC ‘Street Signs Asia’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잃어버린 대미국 수출을 베트남이 대신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중국 생산품으로 베트남으로 옮긴 다음 베트남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 관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실제 제조 기업들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생산 비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조치도 다른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데 일조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10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대기업이 다른 국가로 제조 라인을 옮기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은 무역분쟁의 영향을 최대한 덜 받기 위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교세라, 샤프는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확장했고, 일본의 패스트리테일링, 리코(Ricoh), 닌텐도, 미국의 델(Dell), 중국의 고어텍(GoerTek), 구이저우타이어Guizhou Tyre), TCL 등은 베트남으로의 생산 기지 확장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베트남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생산 수요가 베트남에서 몰리면서 생산성에 한계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베트남의 생산율은 0.27%에 불과하다. 중국의 28.22%라는 거대한 생산율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미국은 17.23%이다.
베트남의 취약점 중 하나는 인적 자본의 부족이다. 인적 자본은 곧 노동력이 가지는 경제 가치로, 교육 정도, 기술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현재 베트남은 생산성이 높은 20~30대 세대 비율이 큰 이른바 ‘젊은 국가’에 속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력 규모는 중국에 비해 턱없이 작다.
더욱이 양질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베트남 전문뉴스 인사이드비나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의 인적자원 질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3.79점으로 아시아 12개국 중 11위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취약점은 인프라 부족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218년 기준 베트남의 인프라지수는 3.9(1~7점이 기준이며, 7에 가까울수록 인프라 구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으로, 조사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79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차이나’로 삼기에 현재로써 베트남만한 국가가 없다. 인프라 부분에 있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DP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도운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였다. 바꿔 말해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경제 성장 둔화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베트남만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